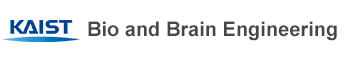bioeng_admin
2006-06-01 16:09:00
0
2787
먼지보다 작은 칩에 생체 움직임 담는다
“니는 항상 반 박자가 빠른 게 문제 아이가~.”
친구들은 조영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곤 한다. 한 박자가 빨랐다면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 아예 도태됐을 텐데 반 박자가 빠르다보니 앞에서 길을 닦아주는 고된 일을 모두 떠맡아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것.
대신 조 교수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여러 개 얻었다. ‘미국 멤스 1호 기계공학박사’도 그 중 하나다.
자동차 에어백 가속도센서 최초 개발
멤스(MEMS)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수㎛(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에서 수 mm크기의 마이크로 머신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머리카락 굵기가 70㎛정도니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짐작할 수 있다.
멤스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지난 1990년 조 교수는 멤스 기술의 발생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극미세 정전 구동기를 개발해 멤스 분야에서 최초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1년 조 교수는 한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멤스 기술로 자동차 에어백에 쓰이는 가속도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차시험까지 수행했다.
당시 에어백에는 대부분 기계식 가속도센서가 달려 있었다. 기계식 가속도센서는 자동차가 충돌하면 가속도센서에 있는 추와 같은 이동체가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로 코일 사이를 움직이고,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충돌 여부를 판단한다.
기계식 가속도센서는 각각의 부품을 따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 반면 멤스 가속도센서는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을 이용해 센서를 하나의 작은 부품으로 만들 수 있다. 반도체 칩과 다른 점은 실리콘 기판위에 하나의 층을 더 두어 기계와 전자가 복합된 3차원 구조의 센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멤스 가속도센서는 크기가 작고 반도체 칩처럼 대량생산할 수 있어 가격이 기존 센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조 교수가 현대자동차와 멤스 가속도센서를 개발한 뒤 에어백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듬해 조 교수는 삼성전자와 함께 캠코더의 손떨림 보정센서(자이로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보통 손떨림 보정에는 압전 세라믹을 이용한다. 멤스 자이로센서는 물체의 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힘을 측정해 영상의 떨림을 막는다. 이 기술은 요즘 디지털카메라에 쓰이는 손떨림 방지 기술의 모태가 됐다.
조 교수는 캠코더에 이어 잉크젯 프린터 헤드에도 멤스 기술을 적용했다. 잉크젯 프린터의 해상도는 종이 위에 뿌리는 잉크방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작은 잉크방울을 뿌릴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종이와 맞닿는 잉크젯 프린터의 헤드다. 헤드의 구멍(노즐) 크기가 작을수록 잉크방울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런데 잉크방울 크기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그만큼 잉크방울을 여러 번 분사해야하고 이 때문에 고해상으로 인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 교수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즐 하나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잉크방울을 분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잉크방울 하나의 최소 크기는 6pl(피코리터, 1pl=10-12l) 정도다. 올해 초 조 교수는 6pl부터 36pl까지 6pl 단위로 잉크방울의 크기를 조절해 분사할 수 있는 극미세 잉크분사기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이용하면 촘촘히 프린트해야 할 부분에는 6pl 짜리를, 조금 성기게 프린트해도 되는 부분에는 36pl를 선택적으로 분사할 수 있어 고해상도 영상을 프린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근육 동작 모방한 ‘근육칩’
“생명체는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만드는 것이죠.”
잉크 분사 기술을 설명하던 조 교수가 대뜸 생명체 얘기를 꺼낸다.
예를 들어 인체에서는 미오신과 액틴 같은 기본근육섬유의 움직임들이 모여 근육과 골격이 움직인다. 이 때 미오신과 액틴은 12나노미터(nm, 1nm=10억분의 1m)의 일정한 움직임만 만들어 낸다. 디지털이란 뜻이다. 필요한 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러한 일정크기의 움직임들을 근육에서 직렬연결 할 것인지, 병렬연결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를 만들 수 있다.
극미세 잉크분사기도 이런 생명체의 원리를 이용해 개발했다. 노즐에 달린 히터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히터의 조합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잉크방울의 크기를 결정한 것이다.
2000년 디지털나노구동연구단이 설립되면서 조 교수의 이런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에는 극미세 생체 근육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응용해 광신호나 바이오 물질 정보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근육칩’(디지털 나노구동기)을 개발했다. 근육칩은 약 100만분의 1mm 거리를 1초에 7200번 왕복한다. 조 교수는 “근육칩은 3~4년 안에 마이크로 로봇이나 광통신 및 바이오물질 탐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나노구동연구단은 2단계 평가를 마쳤다. 2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3단계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체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초 연구에 주력했다면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연구를 실제로 특정 제품에 적용해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 중 하나로 미토콘드리아가 주름벽을 이용해 단위 세포당 파워를 극대화하는 것에 착안해 휴대전화용 충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파워 측면에서는 화재경보기의 배터리 용량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휴대용 전화 등 충전 배터리의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영호 교수는
경북 대구 출신인 조 교수는 대학까지 대구에서 마쳤다. 4형제 중 둘째였던 그는 어린 시절 집에서 유일한 말썽꾸러기였단다. 하수구에 빠지고 그네 밑에 들어가 다치기 일쑤고,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시작하면 밤새도록 거기에만 빠졌다. 중학교 때는 공이 안보일 정도로 어두워질 때까지 핸드볼을 즐겼다. 가방은 도서관에 있는 친구에게 맡겨두고 말이다. 그래도 성적은 좋았다.
고등학교 때는 시와 소설의 매력에 반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이 버릇이 아직도 남아 요즘도 독서량에 있어서는 연구단 식구를 통틀어 단연 1위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제국의 번영에는 로마의 포용력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편식은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고. 부모님들의 권유로 지원한 의대 입시에 떨어진 뒤 영남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해 수석으로 학부를 졸업했다.
KAIST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KAIST와 인연의 시작이었다. 1982년 KAIS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86년까지 KIST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유학길에 올라 1990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멤스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디지털나노구동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2002년부터는 바이오·나노·전자·정보 융합기술 분야의 신설학과인 바이오시스템학과 교수로 있다.
미래의 과학도에게 한 마디
‘최초’와 ‘최고’는 다르다. 무언가 최초로 한 사람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확률은 높지만 최초의 길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고 어렵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초기에는 어색하고 생소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다.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도 빠른 경우가 많다.
글/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2006년 06월 1일)
“니는 항상 반 박자가 빠른 게 문제 아이가~.”
친구들은 조영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곤 한다. 한 박자가 빨랐다면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 아예 도태됐을 텐데 반 박자가 빠르다보니 앞에서 길을 닦아주는 고된 일을 모두 떠맡아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것.
대신 조 교수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여러 개 얻었다. ‘미국 멤스 1호 기계공학박사’도 그 중 하나다.
자동차 에어백 가속도센서 최초 개발
멤스(MEMS)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수㎛(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에서 수 mm크기의 마이크로 머신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머리카락 굵기가 70㎛정도니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짐작할 수 있다.
멤스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지난 1990년 조 교수는 멤스 기술의 발생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극미세 정전 구동기를 개발해 멤스 분야에서 최초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1년 조 교수는 한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멤스 기술로 자동차 에어백에 쓰이는 가속도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차시험까지 수행했다.
당시 에어백에는 대부분 기계식 가속도센서가 달려 있었다. 기계식 가속도센서는 자동차가 충돌하면 가속도센서에 있는 추와 같은 이동체가 급격한 가속도의 변화로 코일 사이를 움직이고,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충돌 여부를 판단한다.
기계식 가속도센서는 각각의 부품을 따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 반면 멤스 가속도센서는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을 이용해 센서를 하나의 작은 부품으로 만들 수 있다. 반도체 칩과 다른 점은 실리콘 기판위에 하나의 층을 더 두어 기계와 전자가 복합된 3차원 구조의 센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멤스 가속도센서는 크기가 작고 반도체 칩처럼 대량생산할 수 있어 가격이 기존 센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조 교수가 현대자동차와 멤스 가속도센서를 개발한 뒤 에어백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듬해 조 교수는 삼성전자와 함께 캠코더의 손떨림 보정센서(자이로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보통 손떨림 보정에는 압전 세라믹을 이용한다. 멤스 자이로센서는 물체의 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힘을 측정해 영상의 떨림을 막는다. 이 기술은 요즘 디지털카메라에 쓰이는 손떨림 방지 기술의 모태가 됐다.
조 교수는 캠코더에 이어 잉크젯 프린터 헤드에도 멤스 기술을 적용했다. 잉크젯 프린터의 해상도는 종이 위에 뿌리는 잉크방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작은 잉크방울을 뿌릴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종이와 맞닿는 잉크젯 프린터의 헤드다. 헤드의 구멍(노즐) 크기가 작을수록 잉크방울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런데 잉크방울 크기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그만큼 잉크방울을 여러 번 분사해야하고 이 때문에 고해상으로 인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 교수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즐 하나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잉크방울을 분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잉크방울 하나의 최소 크기는 6pl(피코리터, 1pl=10-12l) 정도다. 올해 초 조 교수는 6pl부터 36pl까지 6pl 단위로 잉크방울의 크기를 조절해 분사할 수 있는 극미세 잉크분사기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이용하면 촘촘히 프린트해야 할 부분에는 6pl 짜리를, 조금 성기게 프린트해도 되는 부분에는 36pl를 선택적으로 분사할 수 있어 고해상도 영상을 프린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근육 동작 모방한 ‘근육칩’
“생명체는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만드는 것이죠.”
잉크 분사 기술을 설명하던 조 교수가 대뜸 생명체 얘기를 꺼낸다.
예를 들어 인체에서는 미오신과 액틴 같은 기본근육섬유의 움직임들이 모여 근육과 골격이 움직인다. 이 때 미오신과 액틴은 12나노미터(nm, 1nm=10억분의 1m)의 일정한 움직임만 만들어 낸다. 디지털이란 뜻이다. 필요한 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러한 일정크기의 움직임들을 근육에서 직렬연결 할 것인지, 병렬연결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를 만들 수 있다.
극미세 잉크분사기도 이런 생명체의 원리를 이용해 개발했다. 노즐에 달린 히터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히터의 조합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잉크방울의 크기를 결정한 것이다.
2000년 디지털나노구동연구단이 설립되면서 조 교수의 이런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에는 극미세 생체 근육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응용해 광신호나 바이오 물질 정보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근육칩’(디지털 나노구동기)을 개발했다. 근육칩은 약 100만분의 1mm 거리를 1초에 7200번 왕복한다. 조 교수는 “근육칩은 3~4년 안에 마이크로 로봇이나 광통신 및 바이오물질 탐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나노구동연구단은 2단계 평가를 마쳤다. 2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3단계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체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초 연구에 주력했다면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연구를 실제로 특정 제품에 적용해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 중 하나로 미토콘드리아가 주름벽을 이용해 단위 세포당 파워를 극대화하는 것에 착안해 휴대전화용 충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파워 측면에서는 화재경보기의 배터리 용량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휴대용 전화 등 충전 배터리의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영호 교수는
경북 대구 출신인 조 교수는 대학까지 대구에서 마쳤다. 4형제 중 둘째였던 그는 어린 시절 집에서 유일한 말썽꾸러기였단다. 하수구에 빠지고 그네 밑에 들어가 다치기 일쑤고,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시작하면 밤새도록 거기에만 빠졌다. 중학교 때는 공이 안보일 정도로 어두워질 때까지 핸드볼을 즐겼다. 가방은 도서관에 있는 친구에게 맡겨두고 말이다. 그래도 성적은 좋았다.
고등학교 때는 시와 소설의 매력에 반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이 버릇이 아직도 남아 요즘도 독서량에 있어서는 연구단 식구를 통틀어 단연 1위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제국의 번영에는 로마의 포용력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편식은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고. 부모님들의 권유로 지원한 의대 입시에 떨어진 뒤 영남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해 수석으로 학부를 졸업했다.
KAIST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KAIST와 인연의 시작이었다. 1982년 KAIS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86년까지 KIST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유학길에 올라 1990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멤스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디지털나노구동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2002년부터는 바이오·나노·전자·정보 융합기술 분야의 신설학과인 바이오시스템학과 교수로 있다.
미래의 과학도에게 한 마디
‘최초’와 ‘최고’는 다르다. 무언가 최초로 한 사람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확률은 높지만 최초의 길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고 어렵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초기에는 어색하고 생소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다.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도 빠른 경우가 많다.
글/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2006년 0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