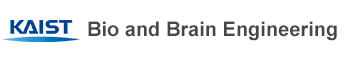bioeng_admin
2007-03-15 15:54:46
0
80
"인지과학이 무한 부가가치 생산할 것"
[인지과학에 미래 달렸다]
이수영 KAIST 뇌과학연구센터장… "돈·사람·시설 세 가지부터 보충해야"
KAIST 뇌과학연구센터는 국내 인지과학의 심장부다.
센터는 1998년 과학기술부 ‘뇌연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장기 프로젝트(연구비 253억원)로 설립됐다. 지금까지 ▦인공두뇌 기본 모형 및 인공비서 개발 ▦차세대 뇌 기능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만 1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인지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편될 미래산업을 감당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센터장인 이수영(KAIST 전기전자공학전공ㆍ사진) 교수는 “인지과학이 자리를 잡으려면 돈, 사람, 시설 등 부족한 세가지 부터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구비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인지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비를 지원한건 지난해 10억원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과학, 의학, 공학, 인지과학 등 모든 뇌 관련 연구를 망라해 연구비(매년 25억원)가 지원됐다. 이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인지과학의 연구비 수준은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정도”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연구장비도 형편없이 부족하다. 인공두뇌 기본 모형 개발엔 성공했지만 인간 두뇌와 흡사한 인공두뇌를 만들기 위해선 뇌 신호측정 등 기초연구가 필수다.
그러나 연구전용으로 쓰이는 ‘고자장(3T) 기능형 자기공명영상(fMRI)’장치는 센터가 2001년 들여온 게 전부다.
그는 “장비가 없다 보니 연구자들이 주로 대형병원의 업무가 끝나는 밤 시간에 많은 돈을 들여 병원 MRI장치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비용도 문제지만 밤 늦게 연구를 진행하면 실험 대상자의 생활리듬이 깨져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인지과학 연구자의 수도 절대 부족하다. 선진국에선 대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자연과학과 결합한 인지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인지과학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다.
이 교수는 “절실히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대학원에 정식 학과로 인지과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보다 10년 정도 뒤진 연구기간도 따라잡아야 한다. 이 교수는 정부와 학계, 기업의 3각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초반에 인지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에 골몰하는 기업은 성공여부도 불확실하고 기간 역시 5년 이상 걸리는 연구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인지과학은 앞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술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인지과학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정부, 연구소,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산(産)ㆍ학(學)ㆍ정(政) 협력시스템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인지과학에 미래 달렸다]
이수영 KAIST 뇌과학연구센터장… "돈·사람·시설 세 가지부터 보충해야"
KAIST 뇌과학연구센터는 국내 인지과학의 심장부다.
센터는 1998년 과학기술부 ‘뇌연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장기 프로젝트(연구비 253억원)로 설립됐다. 지금까지 ▦인공두뇌 기본 모형 및 인공비서 개발 ▦차세대 뇌 기능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만 1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인지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편될 미래산업을 감당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센터장인 이수영(KAIST 전기전자공학전공ㆍ사진) 교수는 “인지과학이 자리를 잡으려면 돈, 사람, 시설 등 부족한 세가지 부터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구비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인지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비를 지원한건 지난해 10억원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과학, 의학, 공학, 인지과학 등 모든 뇌 관련 연구를 망라해 연구비(매년 25억원)가 지원됐다. 이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인지과학의 연구비 수준은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정도”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연구장비도 형편없이 부족하다. 인공두뇌 기본 모형 개발엔 성공했지만 인간 두뇌와 흡사한 인공두뇌를 만들기 위해선 뇌 신호측정 등 기초연구가 필수다.
그러나 연구전용으로 쓰이는 ‘고자장(3T) 기능형 자기공명영상(fMRI)’장치는 센터가 2001년 들여온 게 전부다.
그는 “장비가 없다 보니 연구자들이 주로 대형병원의 업무가 끝나는 밤 시간에 많은 돈을 들여 병원 MRI장치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비용도 문제지만 밤 늦게 연구를 진행하면 실험 대상자의 생활리듬이 깨져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인지과학 연구자의 수도 절대 부족하다. 선진국에선 대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자연과학과 결합한 인지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인지과학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다.
이 교수는 “절실히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대학원에 정식 학과로 인지과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보다 10년 정도 뒤진 연구기간도 따라잡아야 한다. 이 교수는 정부와 학계, 기업의 3각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초반에 인지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에 골몰하는 기업은 성공여부도 불확실하고 기간 역시 5년 이상 걸리는 연구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인지과학은 앞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술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인지과학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정부, 연구소,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산(産)ㆍ학(學)ㆍ정(政) 협력시스템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고찬유기자 jutdae@hk.co.kr